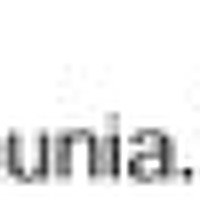이것은 나를 불편하게 했던 하루에 대한 작은 이야기다. 파업하는 노동자가 참으로 쉽게 매도당하던, 그리고 한 아나운서가 참으로 쉽게 죽임을 당하던 그 날의 이야기이고 때론 너와 나의 이야기이다.
개당 1천원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의 노동자가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부분파업은 말처럼 회사를 멈추는 전면파업(물론 사측은 언제나 대체인력이 있고 비노조원이 있다)과는 다르다. 그들 역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식의 2-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의 요구는 '주간 2교대 근무와 월급제'였다. 그 요구안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업은 하루도 안되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기업이 했다.) 이후 기업의 내부문건에서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사전 계획임이 들어나고 있다. 그렇게 기다렸다는듯이 모든 주요일간지에선 국가경제와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1면의 표제어로 사용하며 노조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함께 인쇄했다. 현장의 노사문제를 보통 기사화하지 않는 우리사회 주요언론에선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노동자 200여명이 개당 1천원하는 자동차부품을 만들지 않아 우리 국가경제와 자동차산업이 휘청거린다는 말을 다급하게 쏟아 내었다. 그들 중 누구는 외부세력을 만들었고, 일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쇠파이프 단어를 사용했다.
그와함께 우리들은 '평균 연봉 7천'이라는 단어에 멈칫했다. 귀족노동자라는 참으로 역설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던 우리들은 이로써 노동자를 '너'로 그들의 투쟁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성기업의 엄연한 외부세력은 '현대기아 자동차'였고 그들은 거리낌없이 하청기업의 노동자를 폭력집단으로 우리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불순세력으로 몰아세웠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업은 그들과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단 한번의 형식적인 테이블에서 자본가는 시계의 초침만을 바라 볼 뿐이었다. 그 시계의 초침이 향하는 곳은 공권력 투입 시간이었다. 연봉 7천만원짜리 귀족들의 불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은 사실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노동불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하지만 ‘유성기업의 공개된 급여 명세표를 들여다보면 8년차 노동자 월급은 연장근로 30시간, 휴일특근 15시간, 세금, 보험 포함해 251만원. 퇴직금 포함해 계산해도 연봉 3천만원 수준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엄연한 노동권과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의 합법파업은 순식간에 불법파업으로 변하였고, 그들 머리위로는 시끄러운 경찰헬기가 하루종일 돌기 시작했다. 하루 일당 몇십만원의 용역 깡패가 대포차로 노동자 13명에게 달려들어 중경상을 입혀도 그 살인미수자는 단순 교통법으로 석방되었고, 서울에서는 작은 도시 작은 공장으로 몇 천명의 무장 경찰을 내려보냈다. 그들은 이미 연봉 7천만원짜리 귀족이기 때문에 단지 ‘너’의 싸움이었고, 그들은 국가경제를 흔드는 불순 불법 폭력 집단 세력이였으므로 담장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과 나’에 의해 끌려나가도 할 말이 없었다. 이것은 사측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간 2교대와 월급제’를 주장한 노동자가 부분파업을 한 뒤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같은 날 오전, 한 아나운서가 19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나는 여기서 그녀의 죽음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마음은 없다. 앞서 말했듯이 다만 같은 날에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과 한 무리 노동자의 죽음이 나에게 가져다 준 ‘불편함’, 그 날의 일은 때론 너와 나의 일이며 우리는 여기서 가해자이기도 또한 피해자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죽음에 그녀는 짧지만 분명한 말을 했고, 그녀의 짧은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쏟아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픔을 보듬을 길이 없어 ‘죽고싶다’라는 말을 통해서 ‘죽고싶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것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픔의 원인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앞서 노동자의 죽음은 분명 자본에 의한 폭력이었고, 한 여성의 죽음은 분명 남성에 의한 폭력이었다. 그녀가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일기장 내용의 현실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본 발정난 남성이 흥분의 단어를 쏟아내었다. 누구는 방송과 언론의 선정성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네티즌의 무분별한 악플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선정성과 악플은 모두 ‘그’가 ‘그녀’였기에 가능했던 남성의 폭력이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불편함’은 이것이 아니다. 그녀가 지적한 아픔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집단묵비 현상, 그녀가 지목한 ‘남성의 폭력’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모든 남성의 2차가해이다. 그들과 그녀가 지목한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에 대해서는 여전히 듣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자본과 남성이 한 배에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성인 내가 불편한 이유이다. 인간보다 자본의 편에 선 우리는, 여성보다 남성의 편에 선 우리는 무관심 자체가 누군가에겐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임금 노동자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서 모순과 예정된 갈등(또는 예정된 폭력) 속에 살아가야 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주간 2교대와 월급제’는 분명 우리의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목소리 대신 기업과 정부의 말만 들었다. 또한 한 여성이 죽기 직전 그녀가 당한 ‘남성의 폭력’을 듣는 대신 여전히 언론과 남성의 말만을 듣는다. 그리고 그순간 노동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 끌려갔고, 여성은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육체를 갖고 뛰어 내렸다. 나는 나와 우리가 가해자이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불편하다.
-
(아래는 몇 가지 기사이다. 경향신문은 논조와는 역설적으로 ‘쇠파이프’라는 단어를 등장시켜 자본의 내면을 숨김없이 드러내었고, 한겨레 역시 방송의 선정성을 기사화하며 선정적인 사진을 그대로 노출시켜 고인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매일과 데일리는 언제나 문학 등단을 위한 기사를 쓰니 여기서 할 말은 없고, 노컷신문의 기사는 한 번 볼 만하다.)
[노컷] '유성기업 사태' 언론 보도, 기자에게 영혼이 없다 http://bit.ly/mvc222
[경향] 2시간 만에 유성기업‘상황 끝’ http://bit.ly/kyjctt
[매일] 조현오 ‘유성기업에 외부세력 개입’ http://bit.ly/l6IBbq
[데일리] "연봉 7천 받으며 국민경제 망치려 드나" http://bit.ly/jCN6dp
[한겨레] ‘허벅지 드러낸 아나운서’ 방송사부터 반성해야 http://bit.ly/mNMvQz
'세상을 보니 > 유리창 (시선/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희망버스가 정차하는 희망정류소를 세워주세요. (0) | 2011.07.15 |
|---|---|
| 눈물이 부끄러웠던 그 해의 기억, 열사와 김진숙 (0) | 2011.06.15 |
| 조카와 색칠놀이. 창의성은 생활에서. (0) | 2011.05.06 |
| 5월1일은 노동절. 인터내셔널. (0) | 2011.04.29 |
| 두물머리에 작은 텃밭들이 봄처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0) | 2011.04.21 |